[##_1R|1151715934.jpg|width=”1″ height=”0″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
[##_1L|1195984810.jpg|width=”550″ height=”120″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
① 시대를 건져올린 영국의 낚시법
[##_1L|1151715934.jpg|width=”400″ height=”301″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
영국은 세계 정치역사에서 선도적 역량을 보여왔다. 왼쪽부터 전후 복지국가를
건립한 애틀리 수상, 신자유주의 물결을 주도한 대처 수상, 제3의 길을 주창한 블레어 수상
왜 영국인가
2003년부터 유학생활을 시작한 나에게 영국은 알면 알수록 더욱 더 흥미로워지는 나라임에 분명하다. 특히 사회 정책에 있어, 그리고 정치에 있어 그 흥미로움은 더욱 진지해진다. 기실 현대의 정치ㆍ사상적 흐름과 사회ㆍ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영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잘 알고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현대 복지국가의 모델을 구축했던 나라가 영국이다. 그리고 복지 축소와 시장 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며 등장했던 80년대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조류 역시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대처가 이끌었다.
그리고 또 다시 90년대, 기든스와 블레어의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듯 구좌파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의 논의를 촉발하고 세계적인 논의를 이끌었던 나라 역시 영국이었다.
정치ㆍ언론ㆍ학계의 삼각구조
그렇다면 이러한 영국의 정치적, 제도적 선도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는 5년 동안 영국에서 정치와 제도 발전을 연구하고, 매일같이 방송과 신문에서 뉴스를 탐독하고, 많은 공무원과 학자들을 만나면서 내내 따라다녔던 고민이다.
첫 번째 관심은 정치인에게 꽂혔다.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언사, 지극히 정략적인 행동양식, 정책의 본질적 쟁점에 대한 무지 내지는 무시,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 언제나 국민을 갖다 붙이며 몸을 내던지기를 불사하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우리나라 정치인은 영국의 정치인과 언제나 대조적일 수 밖에 없었다.
기실 영국 뉴스와 방송에서 만나게 되는 영국 정치인의 모습은 정치인에 대한 고정관념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의원내각제의 전통으로 수십 명의 정책차관(Minister)들이 포진하는가 하면, 내각의 어느 누구도 쪽지에 의존해 답변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송과 신문으로 보도되는 대상보다 언론 자체에 대해 관심과 시각이 트이기 시작했다. 오른쪽의 타임즈(The Times)에서 왼쪽의 가디언(The Guardian)에 이르기 까지, 입장은 가지되 사실과 뒤섞지는 않는, 그래서 평론(Commentary)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항상 보도면과 명확히 구분되어 뒤편에 의견면이 자리하는 것이 우선 인상적이었다.
의견면에는 각 신문이 내세우는 화려한 전문 칼럼리스트들이 쏟아내는 다양한 비평이 들어차 있다. 여기에서 정연한 논리 속에서 치열한 정치적 토론과 정책적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필자를 편집자의 이름으로 가린 사설이 전면에 나서고, 기자나 교수들이 토막으로 쓰는 짤막한 단상 수준의 의견이 거의 전부인 우리나라 언론공간의 논쟁과는 애초부터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논문을 쓰면서, 영국의 정치사상과 정책발전을 역사적으로 한 시대, 한 시대 분석해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시선은 결국 학문을 하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점 더 관심이 쏠리는 대상은 바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치열하게 사회와 시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쏟아내는 지식인들이었던 것이다.
복지국가 모델의 성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티티머스(Titmuss), 80년대 신자유주의 물결의 기원인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 철학자인 하이에크, 90년대 이후 노동당에게 새로운 정치적 주도권을 가져다 준, ‘제3의 길’을 주창한 사회학자 기든스가 그 지식인들의 이름이었다.
[##_1L|1305226792.jpg|width=”300″ height=”401″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
의회민주주의의 산실인 영국 국회의사당 의회당 건물의 시계탑 빅벤(Big Ben)
시대를 건져올린 영국의 낚시법
하지만 이러한 학계의 이론적 논의가 그대로 실질적인 정치적 논쟁과 논의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둘러싼 두터운 지식인 사회의 구조가 이를 매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이자 개념으로서 최근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다.
복지 국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페이비언 소사이어티(Fabian Society), 신자유주의 사상과 이론이 대처의 보수당 정부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경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IEA), 신노동당의 새로운 흐름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공공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IPPR), 그리고 최근 신노동당의 쇠퇴와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당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보수당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교환소(Policy Exchange) 등이 그들이다.
하지만 모든 영국의 싱크탱크들이 이렇게 정치적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정치적 세력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영국 정치의 저력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들도 포진해 있다.
가장 오래된 싱크탱크 이면서 영국 외교의 막후에서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경제와 재정문제에 대해 항상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치권 밖에서 끊임없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재정연구소, 노동문제에 있어 새로운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는 노동재단,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는 싱크탱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번 연재 ‘시대의 산파, 영국의 싱크탱크’를 통해서는 바로 이러한 싱크탱크들이 영국 현대 정치의 발전에 있어 수행해왔던 역할을 짚어보면서,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다.
영국이 자기 사회에서 직면한 변화와 문제들에 대응해 선도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었던 과정과 구조의 일부로서 싱크탱크들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비전과 전망에 목마른 한국이 얻을 수 있는 함의를 찾아 볼 것이다. 시쳇말로 영국이 잡아 올린 고기 보다는 그 낚시법의 일부로서 살펴보고자 한다는 말이다.
이는 희망제작소의 기획으로 출판되고 있는 ‘세계의 싱크탱크’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연재이다. 따라서 연재되는 내용들은 향후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될 것이다. 이번 연재의 원고는 책 출판을 위한 원고의 축약본일 수밖에 없다.
이 연재로 영국의 싱크탱크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면, 하지만 이 연재로 한참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저자로서 향후에 출판될 책을 기다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 연재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책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그만큼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을 기대한다.
[##_1L|1082397160.jpg|width=”569″ height=”121″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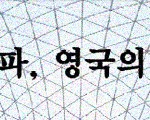


답글 남기기